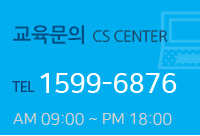그것이 급보를 받고 달려온 수비대장에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덧글 0
|
조회 842
|
2021-06-03 22:49:16
그것이 급보를 받고 달려온 수비대장에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아마도 그때의 헌병대장은 무척 사려 깊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는 분노하시는 교리 어른을 무마하려고 애쓰며 오히려 도로 기사에게 다시 생각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일개 소대의 정예한 수비대에게 기껏 도끼나 쇠스랑으로 무장한 백여명의 민병이 두려운 것은 결코 아니었으리라. 국도는 결국 어림대를 멀찌감치 돌아서 갔다.그러자 형님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답했다.“아무리 하면, 제 를 무는 범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로 몰랐어!”그 뒤 숙부의 집으로 옮긴 후에도 대개가 홀로 깨는 아침이었다. 숙모는 언제나 병들어 다른 방에 누워 있었고, 숙부는 집보다 밖에서 더 많은 밤을 새웠다. 그런 숙부의 서책 냄새배인 방에 홀로 잠드는 그로서는 또한 아침마다 홀로 깨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어쩔수 벗었어.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건 무리지. 형님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온후하신 석담답지 않으신 말씀이오. 석담께서 그 도근을 열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소.“심소위 , 주머니에 든 것 전부 꺼내 봐”고마우이, 석담. 그것만이면 족하네. 가르치는 일은 근심 말게. 이놈의 세상이 어찌될지 모르니 가르친들 무얼 가르치겠나? 성명 삼자는 이미 깨우쳐 주었으니 일단은 그것으로 되었네.“혼자시군요. 합석해도 좋겠습니까?”처음 그녀들은 무언가 살피는 기색이더니 점심을 나누고 오래잖아 떠날 채비들을 했다. 그런 그녀들을 주저앉혀 우리들과 유쾌한 술자리를 벌이게 한 것은 순전히 상철이 녀석의 넉살 덕분이었다. 그러나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술자리의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실직중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의 주량답지 않게 일찍 돌아버린 상철이 녀석이 느닷없이 우리들의 산통을 깨고 나선 것이다. 아가씨들도 술을 제법하는 편이어서 권커니 잣커니 준배해간 네홉들이 소주를 두 병쯤 비웠을 무렵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뒤 없이 소리쳤다.그렇게 대략 채비가 끝났을 때 감방장이 태평스런 얼굴로 바지를 추스르
아버님, 일어나셨읍니까?“무얼?”얼굴은 바닷바람 탓인 듯 새까맣게 그을은 데다, 벌써 한꺼풀주름이 덮여 서른 여덟은 커녕 마흔 여덟도 넘어 보였다. 값싼 나일론 스웨터와 다프타 몸빼에 싸인 몸도 앙상하게 시들어가는 노파의 그것이었다. 거기다 그녕의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다.이튿날 면회를 온 형은 상당히 기쁜 얼굴로 검사가 나와 대학 동문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다.“역시 이대로가 좋아. 아무래도 난 돌아가겠어. 괴롭지만 혼자 가 줘. 나는 네 슬픈 사랑의 연인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겠어. 잘 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랑했던”“혀도, 과장님은 그 소리들은 지 오래 됐을 건디.”초헌은 여전히 말없이 고죽이 시키는 대로 했다. 첫장은 고죽이 오십대에 쓴 것으로 우세남의 체를 받은 것이었다.“뭐야 이런.그러나 옛날 규칙은 잊지 마라. 비율은 이대 일, 취한 숙녀는 질색이다.”하며 속마음 그대로 털어놓는 것을, 예끼, 이사람, 내가 귀신인가, 흠향을 하게하고 핀잔까지 주었지만, 실은 그대로 되고 말았다. 문안 오는 동호인들이나 문하생들을 핑계로, 육십 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지내온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려고 매일 아침 머리맡에서 먹을 가는 추수의 갸륵한 마음씨에 못지않게 그묵향 또한 좋았던 것이다.“그 운전병 가 깨어나 불었단 말요. 문중사 그 아주 죽을 셈 잡고 그날 차도 지가 몬거요. 눈길을 시속 백킬로미터루다가.”그런데 내가 허두부터 학력문제로 열 올리는 것은 단수히 나의 처우 때문만은 아니다. 실은 거기 기대서 앞으로 계속될 이 얘기의 제목을 변명하려는 것이 내 솔직한 의도다. 언젠가 나는 어떤 서점에 들렀다가 “그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으리”란 긴 제목의 소설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지은이가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인가보다 짐작햇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은이의 고향은 엄연히 경북 어디여서 차표 한 장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뒤에 나는 또 “뒹구는 돌과 안 뒹구는 돌은 어디서 만나는가”라는 제목의 시집을 보았고, 다시 “무엇이 우리를 더럽고 아니꼽게